지리산 편지
이음광장 나를 담은, 내가 담긴, 나인 나무
- 글 최은주 작가
- 등록일 2020-11-18
- 조회수698
산골에 가을이 깊었습니다. 이제 논은 비어 흙빛으로 가득하고, 산자락은 오색찬란한 단풍으로 가득합니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나무들은 노란빛 갈빛으로 물들며 발치에 수북이 낙엽을 쌓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다 멀리 크고 너른 가지를 뻗은 나무 아래 자그마한 정자가 숨어 있는 게 보이면 저기에 정 많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겠구나 짐작하게 됩니다. 마을 입구 큰 나무 아래엔 볍씨나 들깨, 콩 등이 널려 있거나, 노인들이 유모차 모양을 한 보행기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기도 합니다. 갈무리한 수확물에 대해 얘기 나누며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하고 가진 것을 바꾸고 나눌 거라는 오지랖 넓은 짐작도 해봅니다. 오래오래 무탈하시라는 바람을 속으로 흘리고 슬며시 미소 지으며 지나옵니다.
집이 자리한 마을에도 삼백년 넘은 느티나무가 마을 정자를 감싸고 서서 오가는 저희를 지켜봅니다. 산자락에 들면 팔백년 된 전나무가 천왕봉을 배경으로 서있고, 옆 동네로 조금 나가면 천년 가까이 살았어도 아직도 청춘이라는 듯이 창창하게 서있는 은행나무가 있답니다. 또 지리산 계곡물이 모여 흘러가는 엄청강가의 느티나무 세 그루는 모진 세월을 다 떠안은 듯 부러지고 찢긴 생채기투성이지만 자신의 아름다움에 반한 나르시스트처럼 강물에 가지를 늘어뜨리며 멋들어지게 서있습니다.
저는 자주 인근의 오래된 나무를 찾아가 그 언저리에서 한참을 머물다가 옵니다. 오래되어 큰 나무를 만나면 그 시간 동안의 무사함에,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눈앞에 존재함에, 작은 바람에도 움직이며 뿜어내는 생명력에 “아!” 하는 외마디 감탄사 말고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음에 스스로 한탄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그냥 있어 아름다운 나무들입니다. 어쩌면 모든 생명이 다 그러할 겁니다. 무얼 해서, 무얼 이루어서, 무얼 가져서 빛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순간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생명인 것입니다.
저에게 나무는 우주라는 공간에 한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인간 군상의 집합체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가지 저 가지가 저마다 각각의 포즈로 삶을 이어가고, 어느 가지는 가까이 만나 조화롭기도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어느 가지는 사는 내내 만날 수 없거나 스쳐 비껴가기도 하고, 한 몸통에서 시작해 연결되기도 흩어지기도 하며 큰 완전체를 이루어가는 나무. 나무는 함께 산다는 것이 아름다운 일임을 보여줍니다.
지난겨울 국도변의 나무들이 저를 위해 군무를 추는 무용수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일렬로 도열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팔과 다리의 형태를 한 나뭇가지를 긋고 휘저어 온갖 선을 그려내며, 하나로도 완전하고 함께여서 더 멋진 군무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무라는 무용수는 무한의 공간인 하늘이라는 무대에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한 가지들로 ‘자유’를 외치고 해를 향해 가지 끝을 하루씩 늘리며 ‘성장’을 이야기하고, 한 자락 바람을 스쳐 보낼 때도 잎을 반짝반짝 흔들며 ‘공감’을 표현하며, 그 안에 깃든 수많은 생명과 함께 사는 ‘연대’를 말하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최은주, <살아있다>, 종이에 아크릴(2020)
오래되고 오래된 나무를 만나는 일, 겸손 할 수밖에
최은주, <여름밤>, 종이에 아크릴(2020)
여름밤 빛나는 별들 속에서 우주의 깊이와 시간 그리고 저 너머 세상으로 가는 길을 본다
나무가 더 좋아지자 내가 하는 모든 작업에 나무를 담고 싶었습니다. 도자기에도 나무를 그리고, 종이에도 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무를 나무처럼 보이게 그리고 싶었다가 이제는 나를 담은, 내가 담긴, 나인 나무를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그리는 나의 나무는 휘고 부러지고 생채기투성이여도 햇살에 잎을 반짝이며 실바람에도 휘청이지만 살아 한 뼘씩 성장하는 나무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지면 더 좋겠습니다. 저의 아름다움은 지금 여기 살아있음과 성장을 위한 노력, 함께 살기 위한 선함이길 바랍니다. 저에겐 요즘 새로운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1,000장의 나무 그림을 그려보자고 마음을 내는 중입니다. 도자기에도 나무를 심고 종이에도 나무를 옮기는데 마음만 앞서갑니다. 겨울이 되어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 조금 더 마음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욕심은 치달아 하늘을 찌르는데 능력은 바닥인 게 여실할 때는 절망스럽습니다. 그래도 하루씩 하나씩 쌓다보면 뭐라도 되어 있으려니 합니다. 안되면 또 어쩌겠어요? 나무 그림을 그릴 거라는 핑계로 좋은 친구와 같이 이 동네 저 동네 오래된 나무를 보러다니는 즐거움이 있으니 그것으로도 좋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제각각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 누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몸과 마음이 따뜻하고, 소소한 행복이 쌓여가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지리산에서 꼼지락 최은주 올림.
최은주
미술작가. 지리산 자락 실상사 근처에 살면서, 잘 먹고 잘 놀고 지금 여기를 함께 살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comaenge@naver.com
최은주
미술작가. 지리산 자락 실상사 근처에 살면서, 잘 먹고 잘 놀고 지금 여기를 함께 살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comaenge@naver.com
상세내용
산골에 가을이 깊었습니다. 이제 논은 비어 흙빛으로 가득하고, 산자락은 오색찬란한 단풍으로 가득합니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나무들은 노란빛 갈빛으로 물들며 발치에 수북이 낙엽을 쌓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다 멀리 크고 너른 가지를 뻗은 나무 아래 자그마한 정자가 숨어 있는 게 보이면 저기에 정 많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겠구나 짐작하게 됩니다. 마을 입구 큰 나무 아래엔 볍씨나 들깨, 콩 등이 널려 있거나, 노인들이 유모차 모양을 한 보행기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기도 합니다. 갈무리한 수확물에 대해 얘기 나누며 서로의 무사함을 확인하고 가진 것을 바꾸고 나눌 거라는 오지랖 넓은 짐작도 해봅니다. 오래오래 무탈하시라는 바람을 속으로 흘리고 슬며시 미소 지으며 지나옵니다.
집이 자리한 마을에도 삼백년 넘은 느티나무가 마을 정자를 감싸고 서서 오가는 저희를 지켜봅니다. 산자락에 들면 팔백년 된 전나무가 천왕봉을 배경으로 서있고, 옆 동네로 조금 나가면 천년 가까이 살았어도 아직도 청춘이라는 듯이 창창하게 서있는 은행나무가 있답니다. 또 지리산 계곡물이 모여 흘러가는 엄청강가의 느티나무 세 그루는 모진 세월을 다 떠안은 듯 부러지고 찢긴 생채기투성이지만 자신의 아름다움에 반한 나르시스트처럼 강물에 가지를 늘어뜨리며 멋들어지게 서있습니다.
저는 자주 인근의 오래된 나무를 찾아가 그 언저리에서 한참을 머물다가 옵니다. 오래되어 큰 나무를 만나면 그 시간 동안의 무사함에,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눈앞에 존재함에, 작은 바람에도 움직이며 뿜어내는 생명력에 “아!” 하는 외마디 감탄사 말고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음에 스스로 한탄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그냥 있어 아름다운 나무들입니다. 어쩌면 모든 생명이 다 그러할 겁니다. 무얼 해서, 무얼 이루어서, 무얼 가져서 빛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순간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생명인 것입니다.
저에게 나무는 우주라는 공간에 한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인간 군상의 집합체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가지 저 가지가 저마다 각각의 포즈로 삶을 이어가고, 어느 가지는 가까이 만나 조화롭기도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어느 가지는 사는 내내 만날 수 없거나 스쳐 비껴가기도 하고, 한 몸통에서 시작해 연결되기도 흩어지기도 하며 큰 완전체를 이루어가는 나무. 나무는 함께 산다는 것이 아름다운 일임을 보여줍니다.
지난겨울 국도변의 나무들이 저를 위해 군무를 추는 무용수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일렬로 도열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팔과 다리의 형태를 한 나뭇가지를 긋고 휘저어 온갖 선을 그려내며, 하나로도 완전하고 함께여서 더 멋진 군무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무라는 무용수는 무한의 공간인 하늘이라는 무대에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한 가지들로 ‘자유’를 외치고 해를 향해 가지 끝을 하루씩 늘리며 ‘성장’을 이야기하고, 한 자락 바람을 스쳐 보낼 때도 잎을 반짝반짝 흔들며 ‘공감’을 표현하며, 그 안에 깃든 수많은 생명과 함께 사는 ‘연대’를 말하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최은주, <살아있다>, 종이에 아크릴(2020)
오래되고 오래된 나무를 만나는 일, 겸손 할 수밖에
최은주, <여름밤>, 종이에 아크릴(2020)
여름밤 빛나는 별들 속에서 우주의 깊이와 시간 그리고 저 너머 세상으로 가는 길을 본다
나무가 더 좋아지자 내가 하는 모든 작업에 나무를 담고 싶었습니다. 도자기에도 나무를 그리고, 종이에도 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무를 나무처럼 보이게 그리고 싶었다가 이제는 나를 담은, 내가 담긴, 나인 나무를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그리는 나의 나무는 휘고 부러지고 생채기투성이여도 햇살에 잎을 반짝이며 실바람에도 휘청이지만 살아 한 뼘씩 성장하는 나무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지면 더 좋겠습니다. 저의 아름다움은 지금 여기 살아있음과 성장을 위한 노력, 함께 살기 위한 선함이길 바랍니다. 저에겐 요즘 새로운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1,000장의 나무 그림을 그려보자고 마음을 내는 중입니다. 도자기에도 나무를 심고 종이에도 나무를 옮기는데 마음만 앞서갑니다. 겨울이 되어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 조금 더 마음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욕심은 치달아 하늘을 찌르는데 능력은 바닥인 게 여실할 때는 절망스럽습니다. 그래도 하루씩 하나씩 쌓다보면 뭐라도 되어 있으려니 합니다. 안되면 또 어쩌겠어요? 나무 그림을 그릴 거라는 핑계로 좋은 친구와 같이 이 동네 저 동네 오래된 나무를 보러다니는 즐거움이 있으니 그것으로도 좋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제각각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 누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몸과 마음이 따뜻하고, 소소한 행복이 쌓여가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지리산에서 꼼지락 최은주 올림.
최은주
미술작가. 지리산 자락 실상사 근처에 살면서, 잘 먹고 잘 놀고 지금 여기를 함께 살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comaenge@naver.com
댓글 남기기
필자의 다른 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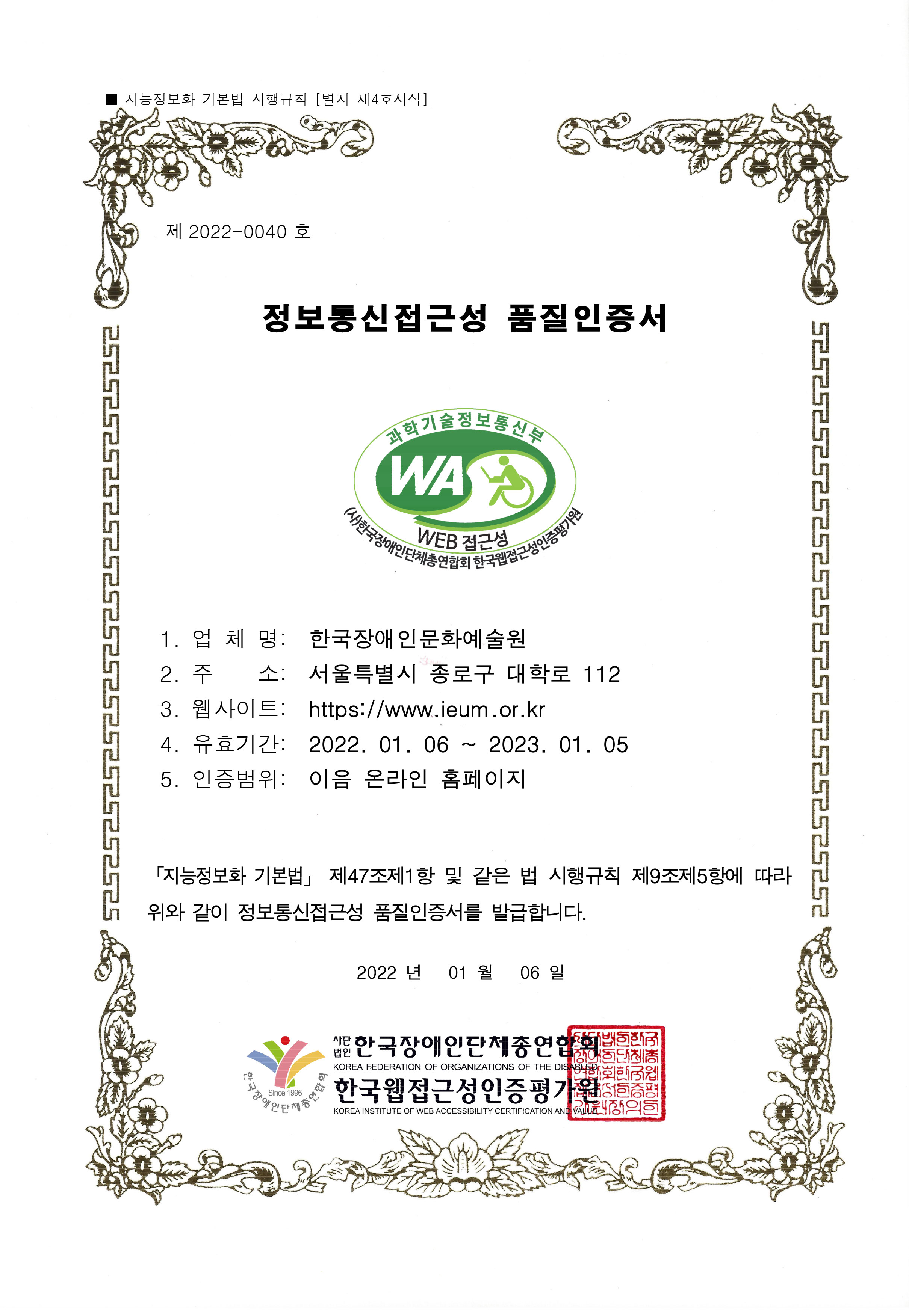




 이전글 보기
이전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