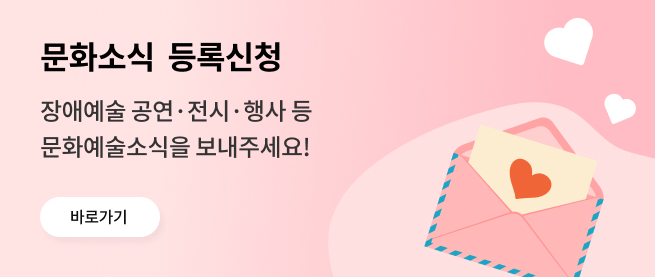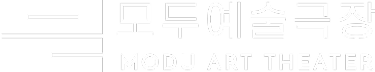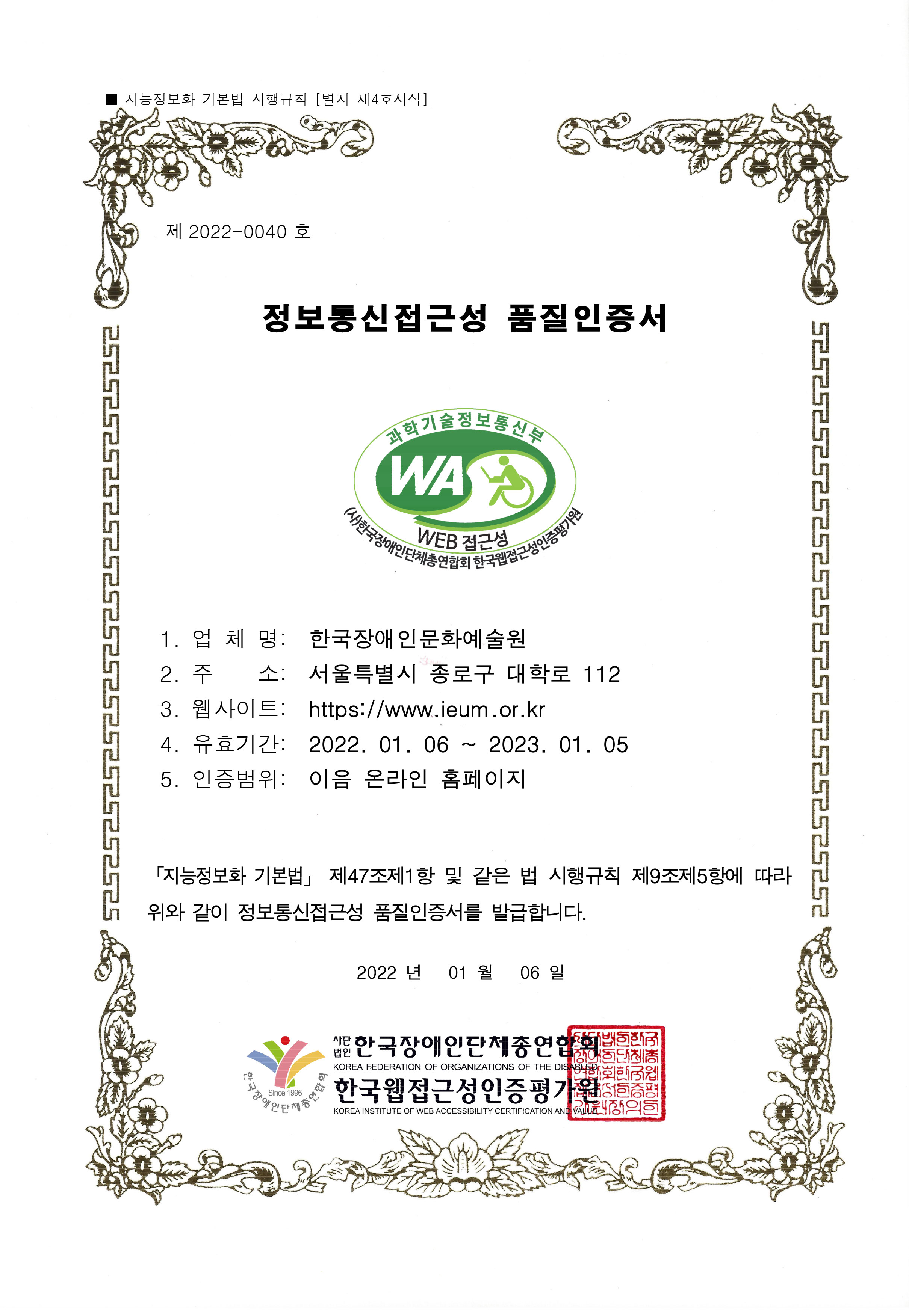이음광장
장애영화를 좋아하고 배리어프리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가끔 해보는 내면의 밸런스 게임을 공유하고 싶다. 여기 두 개의 영화가 극장 상영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이 관객이라면 어떤 영화에 더 점수를 주겠는가?
〈A〉 영화는 장애를 불행이나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관점에서 명확한 연출을 해낸다. 부조리한 현실에 정면으로 저항하고, 장애 혐오를 개인의 악감정이 아닌 사회적 시스템의 의지와 상상력 부족으로 재현하며, 주인공은 연대의 힘으로 위기를 이겨낸다. 그렇게 장애 당사자의 존엄과 가능성은 물론이고 유머와 재미까지 두 마리 토끼를 알차게 담아냈다. 그해 평단으로부터도 장애 감수성과 인권의식이 돋보인 문제작이라며 찬사를 받는다. 한편 이 영화는 자막, 음성해설, 수어통역 등 접근성 요소는 없다. 보통의 영화들이 그렇듯 일반적인 방법으로 상영하고 개봉했다.
〈B〉 영화는 전형적인 극복 서사의 장애영화다. 장애를 개인의 불행으로 치료의 관점에서 재현하고, 보는 이로부터 동정을 구하며, 악당이 나타나 주인공을 괴롭힌다. 이때 따뜻한 선의를 가진 비장애인 영웅 캐릭터가 천사처럼 뿅 등장해 장애인을 구원한다. 결국 기적처럼 장애가 ‘치료’되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비장애인 배우가 힘껏 표정과 손가락을 꼬아대며 어눌한 말투로 장애인을 연기한다.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영화를…? 평단의 평가는 싸늘하다. 한편 이 영화는 배리어프리 자막, 음성해설, 수어통역이 있다. GV(관객과의 대화)에서는 문자통역도 마련되어 있다.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등의 정보를 홍보물에 적시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이동지원을 제공하는 스태프를 극장에 요청해 배치한다.
둘 중 어떤 영화에 점수를 줄까? 나는 늘 고르지 못한다. (당신이라면?) 하지만 살짝궁 마음이 가는 건 〈B〉다. 오르한 파묵의 소설 『내 이름은 빨강』에 나온, “사상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서 결정된다네. 무엇을 그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느냐의 문제지”라는 대사를 떠올려 본다. 진정한 장애영화는 내용보다는 형식이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으면 뭐 하나? 일단 봐야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하지.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영화는 장애 당사자가 평가할 기회조차 없다. 어떤 이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영화나 마찬가지다. 나는 〈B〉 영화를 지지한다. 북미의 장애정의운동가 리아 락슈미 피엡즈나-사마라신하의 저서 『가장 느린 정의』에 따르면 “접근성은 사랑이다.” 그러니, 사랑으로 관람하고 다 같이 욕하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B〉 영화는 정말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볼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도 않다. 현재 배리어프리 영화라는 형식은 ‘프리’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모두를 초대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농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제외한다면 배리어프리 영화가 품을 수 있는 관객층은 한계가 뚜렷하다. 가령 복잡한 영화의 내러티브나 대사 속에 있는 단어를 이해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의 영화 접근성(주1), 폐쇄된 공간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정신장애인, 여러 유형의 중복장애인 등은 대부분 배리어프리 영화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모두를 품는 영화? 상상으로만 가능한 영역이다. 그렇지만 모두를 품지 않는다고 해서 비장애인만 관람 가능한 〈A〉 영화와 같은 선상에 놓는 게 옳은 일일까?
그렇다면 배리어프리 형식이 아닌 모든 예술작품은 비장애 중심주의라는 딱지를 붙여도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멈칫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나는 이런저런 매체, 인터뷰, 극장 무대에서 배리어프리 영화의 중요성과 미학에 관해 떠들어왔다. 가급적 앞으로도 배리어프리 영화를 만들 생각이다. 하지만 내가 어떤 시점에서는 소리와 자막이 일절 없이 오로지 이미지만 존재하는 실험 영화를 만들고 싶고, 배리어프리 버전 없이 그 고유의 침묵과 감각이 작품의 핵심이며, 이를 즐기는 관객과 호흡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 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 시점에서 누군가로부터 말을 바꾼 사람, “결국 너도 에이블리스트”라는 말을 듣는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억울해해도 될까? 안될까? 밸런스 게임으로 시작한 생각의 미로에 오늘도 갇힌다.

2025년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제23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현장. 야외무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영화 〈소영의 노력〉이 상영되고 있다. 이동하는 관객,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관객, 앉거나 서서 보는 관객 등 각자의 방식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오재형
이것저것 하는 예술잡상인. 주로 영화를 만든다. 후반작업의 꽃은 배리어프리 작업이라 생각한다. <피아노 프리즘> <양림동 소녀> <소영의 노력> 등을 연출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등에서 상영한 이력이 있다.
owogud@naver.com
∙ 홈페이지 thelump.imweb.me
사진 제공.필자
2025년 8월 (66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 남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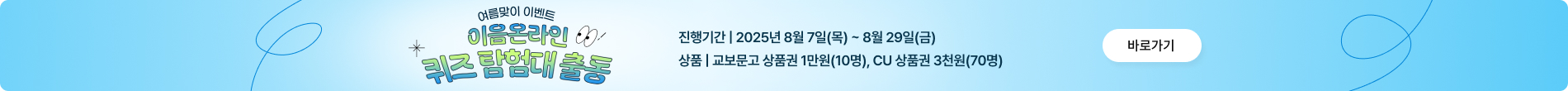

 이전글 보기
이전글 보기
 다음글 보기
다음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