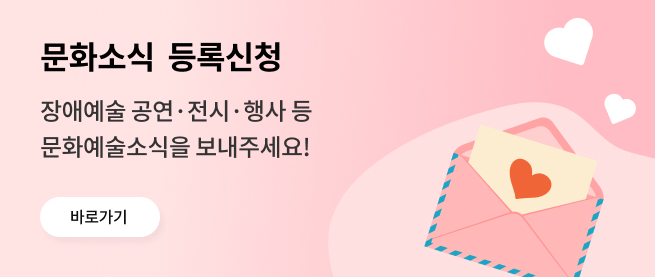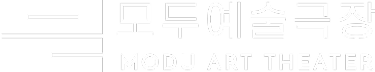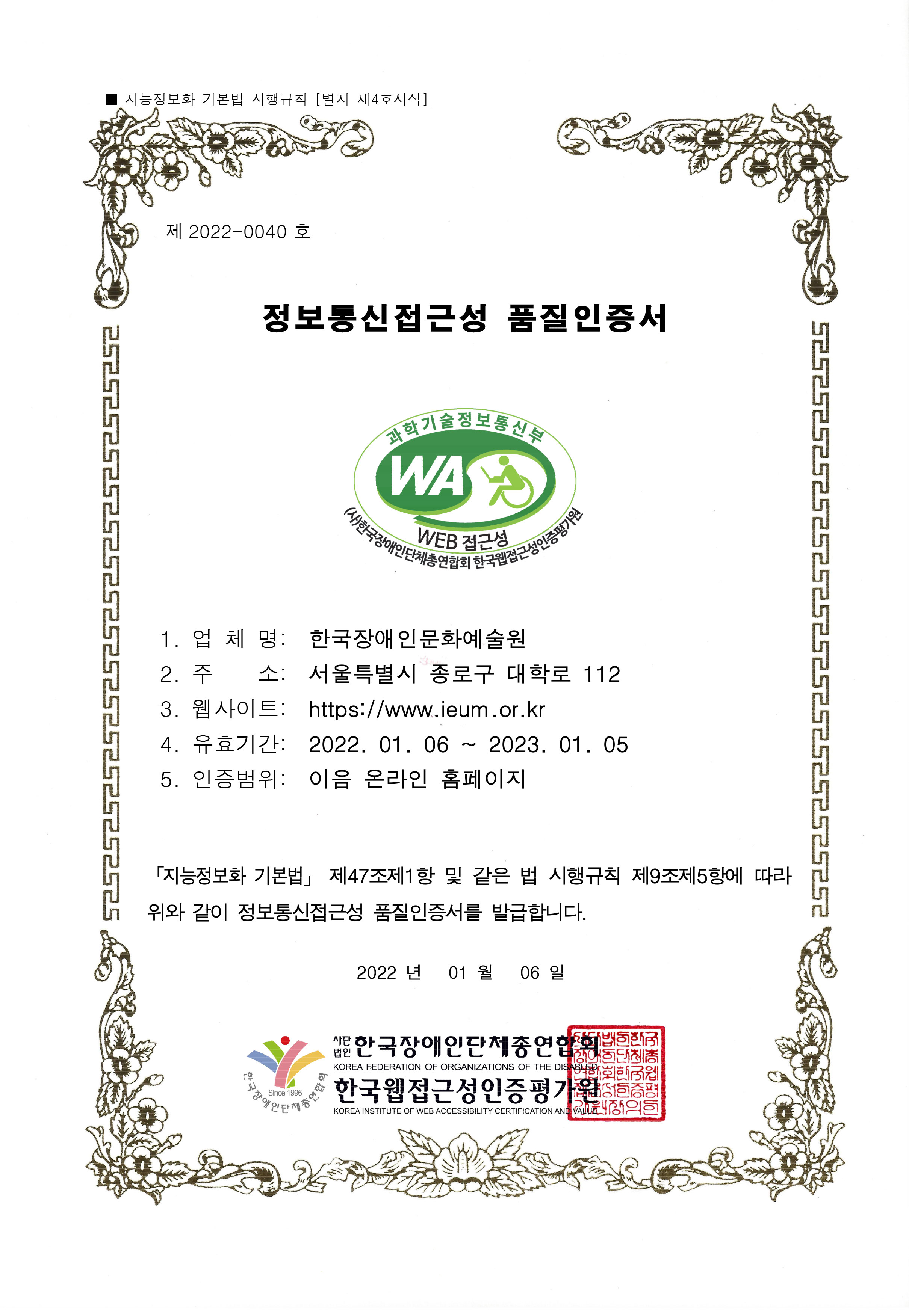트렌드
2021년,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내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에 ‘아르 브뤼(Art Brut)’ 작품 약 1천 점이 기증되었다. 기증자는 프랑스의 영화감독 브뤼노 드샤름(Bruno Decharme)이다. 이번 기증을 기념해 그랑팔레(Grand Palais) 미술관은 보수를 마치고 재개관하며 퐁피두센터와의 협업으로 《아르 브뤼: 컬렉션의 내밀한 세계-퐁피두센터 드샤름 기증전》을 2025년 6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약 3개월간 개최했다. 전시에서는 17세기부터 현재까지, 200여 작가의 작품 약 350점을 선보였고, 7만 5천 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다.
최근 10년 남짓, 일본과 아시아에서도 사회복지와 미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곳에서 아르 브뤼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최되는 장애인의 미술작품 전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르 브뤼는 본디 20세기 프랑스의 예술가 장 뒤뷔페(Jean Dubuffet, 1901~1985)가 본인이 수집한 작품에 직접 붙인 이름으로, 번역하면 ‘날 것의 예술’이라는 뜻이다. 정식 미술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전업화가가 아닌 일반인이나 농촌에 사는 사람, 광부, 영매자, 정신병원 입원 환자 등이 만든 창작물을 일컬었다. 뒤뷔페는 이 말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자기 컬렉션의 호칭으로만 한정했다.
뒤뷔페가 아르 브뤼 컬렉션을 시작한 것은 1945년의 유럽에서였고, 드샤름이 600점에 이르는 아르 브뤼 작품을 수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약 45년간이다. 그 후 약 반세기 동안 사회적·지정학적 배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드샤름은 뒤뷔페가 수집한 ‘원조 아르 브뤼’인 알로이즈 코르바즈(Aloïse Corbaz, 1886~1964) 등 확실한 지위를 획득한 작가의 작품을 수집하는 한편, 아직 가치가 매겨지지 않은 동시대 독창적인 작가들의 작품도 수집했다. 수집 과정에서 아르 브뤼라고 불리는 작품과 작가의 성격도 뒤뷔페의 ‘원조’와는 달라졌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것은 뒤뷔페 컬렉션을 물려받은 스위스 로잔 미술관의 ‘아르 브뤼 컬렉션’도 마찬가지다. 그중에서도 도드라지는 주요한 변화로는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지리적인 영역의 확장(미국, 브라질, 쿠바, 일본 등 유럽 이외의 지역), 작품의 정의와 발상지의 확장(아틀리에에서의 창작활동 등),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에 대한 승인과 평가, 작가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고방식이다.
뒤뷔페와 드샤름이 아르 브뤼라는 이름으로 수집한 컬렉션에는 장애인의 창작물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작품 수집 시 작가의 ‘장애’ 여부는 선정 기준이나 조건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아르 브뤼의 정의인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격리’, ‘고독’ 등의 키워드와 함께 정신병원 입원환자, 즉 정신장애인의 작품이 다수 포함됐다. 네 가지 변화 중 한 가지인 작품의 정의와 발상지 확장으로 인해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장애인의 작품이 더 많이 발견되고 평가되게 되었다. 이 역시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아틀리에나 돌봄 시설에서의 창작품이 ‘아르 브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아틀리에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르 브뤼’의 틀 안에서 소개·평가됨으로써 집단활동 속에서도 개성이 발휘되는 통로가 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사회적 포섭, 그리고 경제활동으로까지 연결되었다.
장애인의 아틀리에 창작과 ‘가교 역할’
드샤름의 컬렉션 중 대표적인 아틀리에(작업실, 공방)로는 이미 잘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아트센터(Creative Growth Art Center)와 오스트리아의 예술가의집 구깅(Art Brut Center Gugging), 독일의 아틀리에 골드스타인(Atelier Goldstein), 그리고 벨기에의 라 에스 그랜드 아틀리에(La S Grand Atelier)가 있다. 일본의 아틀리에로는 코보슈(kobosyu, 사이타마현), 야마나미코보(Yamanami Kobo, 시가현), 아틀리에 코너스(Atelier Corners, 오사카부) 등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전시에서 또렷하게 드러난 것은, 작가와 작품은 물론 아틀리에의 스태프, 조력자, 가족, 친구 등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계기를 만드는 ‘가교’라는 존재의 중요성이다. ‘가교 역할’이란 결국 작품과 상관없이 일상에서 이웃이나 주변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등의, ‘지원’이라기보다는 ‘응시’에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뒤뷔페 시대에도 분명 누군가가 작품과 작가를 발견해 컬렉터와 연결했을 테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나 아틀리에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존재, 그리고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를 조명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한다.
크리스티아네 쿠티치오(Christiane Cuticchio)가 2001년에 창설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아틀리에 골드스타인’ 입구를 장식한 작품은 소속 작가 한스 요르그 게오르기의 ‘비행기’다. 2001년부터 골드스타인에 다니는 게오르기는 판지를 오려 풀로 이어 붙인 비행기를 만들었다. 인간 혹은 동물 같은 생명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작가는 “내 작품과 비행기는 나와 닮았습니다. 세계를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창작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싶다는 사명을 실현한다.
안-프랑수아즈 루슈(Anne-Françoise Rouche)가 1992년에 창립한 벨기에 비엘살름에 있는 ‘라 에스 그랜드 아틀리에’의 창작 프로젝트 ‘아베리아(Averia)’는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기획된 것으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인 ‘천주교 성당’을 테마로 했다. 이렌 제라르는 독특한 성화를 그리고, 로라 델보는 오래된 성당에서 떼어낸 석고상에 옷을 입히듯 컬러풀한 털실을 휘감는다. 성인(聖人)의 유해라고 여겨지는 유품까지 재현되어 있다. 이렇게 테마를 설정하고 여러 작가에 의해 창작된 작품군은 뒤뷔페가 정의한 ‘아르 브뤼’에서 크게 확장된 것이다.
지리적 확장과 아틀리에의 사례로 최근 작품 발굴과 작가의 활약이 눈부신 쿠바, 그중에서도 아바나에 있는 사무엘 리에라가 이끄는 ‘리에라 스튜디오’를 들 수 있다. 마르티네스 두란은 뉴스나 선전·선동 영상을 잘라내 박스로 직접 만든 텔레비전에 끼워 넣는다. 뉴스에서 보는 뻔한 말을 전달하는 한편으로 금수조치라는 무거운 멍에 아래에 있는 소비사회의 꿈을 떠올리게 한다. 라몬 모야 에르난데스는 아티스트로서 일차적 성공을 이루지만, 그 빛에서 멀어져 산과 숲에 틀어박혀 지내며 마대 등으로 자신의 옷도 짓는다.
오사카 아베노의 ‘아틀리에 코너스’는 1981년에 발족한 부모 모임 ‘아베노에서 함께 사는 모임’에서 시작되었고, 2005년에 공간을 지역의 오래된 민가로 옮기고 ‘자유롭게 한다, 승인할 뿐’이라는 방침을 세우며 그때까지 하던 부업 대신 예술활동을 시작했다. 창립 멤버인 니시오카 코지는 악보와 함께 낡은 피아노가 아틀리에에 기증된 몇 년 후부터 악보 필사를 시작했고, 콧노래를 부르며 가사와 음악의 공명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작가 미상과 익명에 관해
뒤뷔페의 컬렉션에는 정신장애인 작가가 익명이나 이니셜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드샤름의 컬렉션에서 현대작가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담아 본명이나 활동명으로 소개된다. 그렇기에 향후에는 작가의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작가의 바이오그래피를 쓰는 방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작가의 삶과 활동을 너무 비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웃는 얼굴이나 행복을 강조하기보다는, 작가와 작품 자체를 충실하게 소개해야 할 것이다.
50년 전에도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에 아르 브뤼 작품 기증을 시도한 적이 있다. 1967년에 프랑스 국립장식미술관에서 전시했던 뒤뷔페의 아르 브뤼 컬렉션을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상설전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우여곡절을 거쳐 1971년에 스위스 로잔시에 기증되었다. 이번 전시는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나 이룬 쾌거다.
드샤름의 45년간의 컬렉터 활동은 작품 수집에만 머무르지 않고 abcd협회(Art Brut, Connaissance et Diffusion. 아르 브뤼의 지식과 보급)를 설립하고, 협회 차원에서 바르바라 샤파르조바(Barbara Szafarzova) 대표와 함께 국내외 전시 기획, 영화제작, 출판, 심포지엄 개최, 교육기관 강의, 국제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었다. 이번 기증 역시 ‘작품’뿐 아니라 그러한 역사와 네트워크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십수 년간 드샤름, 샤파르조바 대표와 만나 전시와 출판, 작가 발굴 등에서 협력한 과정을 통해 이번 전시에도 함께할 수 있었다.
전시기간 중 마지막 나흘 동안에는 전 세계 연구자와 큐레이터가 모여 각자의 연구 분야와 관점으로 아르 브뤼를 논하는 자리가 있었다. 아르 브뤼가 장애인의 아틀리에에서의 창작과 음악, 무용, 연극 등으로 표현의 장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지금, 장애인의 향후 창작활동 확장과 변화, 새로운 해석을 기대한다.

한스-외르그 게오르기(Hans-Jörg Georgi) 〈무제〉, 2021~2024, 판지

알로이즈 코르바즈의 작품들

로라 델보(Laura Delbeau) 〈무제〉, 2014~2016, 석고, 수지, 나무, 물감, 면, 견사, 털실, 면사, 금속, 모피, 플라스틱, 유리 등으로 만든 조소 작품
- 그랑팔레×퐁피두센터, 《아르 브뤼, 컬렉션의 내밀한 세계–퐁피두센터 드샤름 기증전(Art Brut. Dans l’intimité d’une collection. Donation Decharme au Centre Pompidou)》. 그랑팔레 홈페이지 전시 정보
- abcd협회(Art Brut, Connaissance et Diffusion) 홈페이지
- 아틀리에 골드스타인 홈페이지
- 라 에스 그랜드 아틀리에((La S Grand Atelier) 홈페이지
- 예술가의집 구깅(Art Brut Center Gugging) 홈페이지
-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아트센터(Creative Growth Art Center) 홈페이지
- 아틀리에 코너스(Atelier Corners)

가노 레나(Kano Rena)
큐레이터, 예술인류학 연구자. 프랑스 국립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박사(사회인류학 및 민속학).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창작활동을 통해 교류하는 ‘장’을 만드는 〈이웃의 날 - 공동창작 워크숍〉을 주최한다. 기획한 전시로 《우연과, 필연과,》(아츠치요다3331, 2021), 퐁피두센터-그랑팔레미술관 공동주최 《아르 브뤼: 컬렉션의 내밀한 세계》(2025) 등이 있다.
번역. 고주영 공연예술 독립기획자 breeeeze@naver.com
사진 제공. 필자
2025년 10월 (68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 남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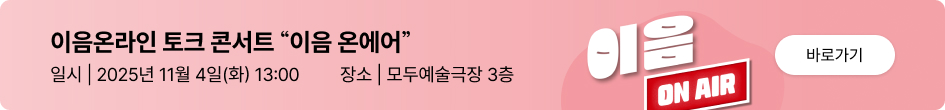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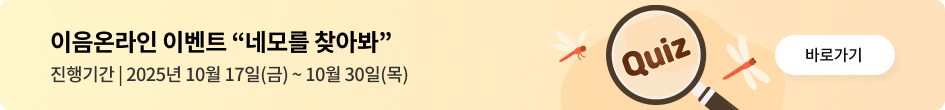

 이전글 보기
이전글 보기
 다음글 보기
다음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