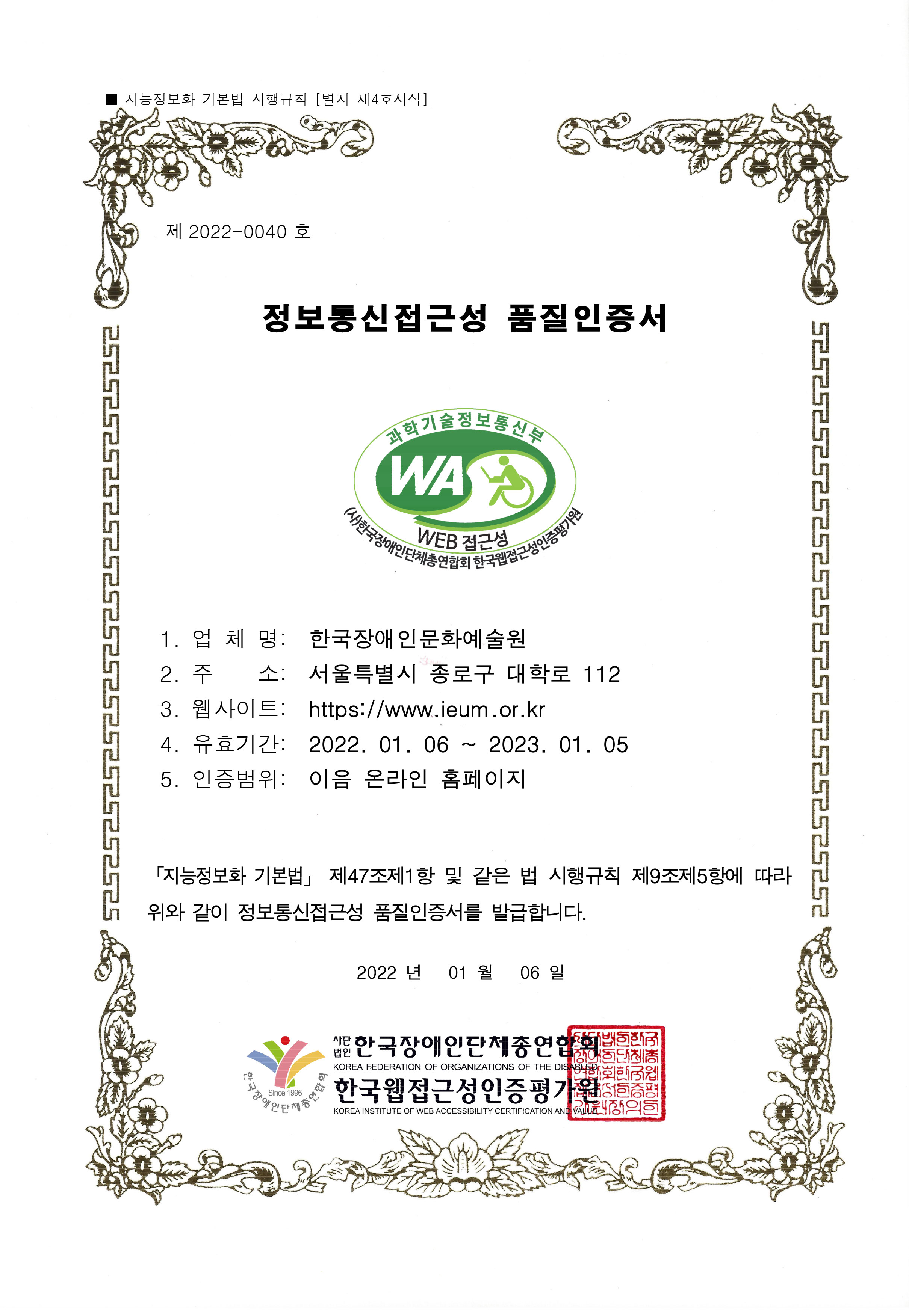이음광장
올해 7월, 친구 젤로(가명. ‘미켈란젤로’의 줄임말)의 연극 무대에 함께 올라 관객에게 질문했다. 대사를 읊는 내내 젤로가 아닌 나를 비춘 스포트라이트 때문이었을까? 얼굴이 계속 화끈거렸던 기억이 난다.
“여러분 저는 젤로의 친구이자 장애인활동지원사이자 동료 예술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선, 저는 누구일까요?
젤로에게, 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께, 저흰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저희에게 누구인가요?”
이날의 주인공은 젤로였지만 젤로는 날 남겨두고 먼저 무대에서 내려갔다. 그렇다고 젤로가 공연을 즐기지 않은 건 아니다. 젤로는 무대 밖에서도 무대를 즐길 줄 아니까. 공연할 때 젤로는 굉장히 신나 보였고, 공연이 끝난 뒤 관객은 환호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찜찜했다. 비장애인인 내가 중증발달장애인인 젤로의 무대를 침해한 건 아닐까. 누군가는 비장애인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장애인을 동원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음…,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나도 조금 억울한데. 하지만 그게 완전히 틀린 생각인가? 난 젤로와 함께라는 이유로 내가 돋보이는 상황을 실제로 종종 마주했고, 심지어 때로는 그 느낌을 즐기기까지 했다. 내심 ‘부럽죠? 당신은 이렇게 멋진 친구 없죠?’라고 생각할 만큼.
올해 3월, 한 평짜리 무대 위에서 10분 동안,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라면 무엇이든 보여 달라는 공연 공모 소식이 ○○극장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젤로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기획 같았다. 젤로는 내 주변 사람 중 가장 솔직한 사람이고 난 평소에 젤로가 보여주는 솔직한 모습에서 곧잘 아름다움을 느꼈다. 추악함은 가리고 솔직함만 부각해 예술로 포장하는 방종한 사람들의 수작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아 왔는가? 자기를 위한 최소한의 변호조차 하지 않는 진정한 솔직함을 통해 (추악함이 아닌) 인간 본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예술가의 미덕이라면, 그 미덕을 필요 이상으로 갖춘 젤로의 삶은 그 자체로 진정한 예술이었다. 가지고 싶으면 갖고, 먹고 싶으면 먹고, 춤추고 싶을 땐 추고, 노래 부르고 싶을 땐 노래하는 모습.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맞으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모습. 젤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공연을 만들고 싶었다. 공연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내가 젤로의 삶을 보며 느끼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길 바랐다.
“젤로. 무대에서 춤춰도 되고, 노래 불러도 되고, 그림 그려도 되고, 간식 먹어도 되는 공연이 있어. 그 무대에서 공연해 볼래?” 젤로는 그러겠다고 했고, 난 무대 위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다. “춤출 때 무슨 노래 틀까? 밝은 조명이 좋아, 아니면 깜빡깜빡 조명? 어떤 노래 부르고 싶어? 그림 그릴 때 그냥 바닥에서 그릴래, 아니면 책상이랑 의자 필요해? 간식은 뭐 먹을까?”
젤로의 대답을 바탕으로 오디션 지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거의 이틀 밤을 새웠다. 젤로의 이름으로 올리는 공연이지만 부탁해서 한 일은 아니었으니 활동지원사로 일하는 시간엔 지원서를 쓰지 않았다. 난 진심으로 젤로가 오디션에 붙어서 무대에 오르길 바랐으나, 그 바람이 오직 그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난 젤로의 오디션을 하나의 중요한 실험처럼 여기고 오디션을 빌미로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다.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전동휠체어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를 이동하듯이, 젤로는 저의 지원을 받아 오디션 지원서를 작성하고 공연을 기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은 젤로와 저의 공연이 아니라 젤로의 단독 기획공연입니다. 발달장애인도 공연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젤로는 오디션에 합격했다. 하지만 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원서에 쓰여 있는 활동지원사의 이름과 연락처, 오디션 무대에 함께 오른 활동지원사의 모습을 보며,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했다. 그들에게, 나는 누구였을까?
처음에 나는 내가 주연도 조연도 아니라 그저 하나의 소품처럼 보이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다. 무대 위에서 젤로만 화려하게 빛나길 바랐다. 그러나 공연 당일 나는 무대 위에서 대사를 외치는 건 물론, 퍼포먼스까지 벌였다. 내 연출 기획안을 보고 친구가 내게 던진 질문 때문이었다.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로 지역사회를 이동하는 것과 활동지원사와 공연을 기획하는 건 너무 다른 일 아니야? 만약 관객에게 젤로의 공연이 프릭쇼처럼 느껴진다면? 젤로가 이 공연의 단독 기획자로서 관객의 비판을 받아내야 할까? 이 공연에서 젤로가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로 그가 공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 젤로의 진심을 네가 다 알 수는 없잖아? 넌 이 공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없어? 과연 네가 이 공연의 공동 기획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젤로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은 오롯이 내 것이었다. 내겐 소품이 아니라 공연기획자로서 관객의 비판을 직면할 책임이 있었다. 마이크를 꽉 움켜쥐었다. 난 소품도 조연도 아닌 주연이 되기로 했다. 난, 젤로의 동료 예술가다.
한 평 무대에서 공연하는 석류와 젤로
(왼쪽 사진 김소리, 오른쪽 영상 캡처. 영상 장혜영)

이준기(석류)
장애인활동지원사, 마포의료사협 무지개의원 방문작업치료사. 병원에서 계약직 작업치료사로 일하다가 장애인의 몸을 교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의료시스템에 환멸을 느껴 병원을 나왔다. 지금은 친구이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인 ‘미켈란젤로’와 함께 동네 친구들을 만나고, 각종 마을 행사에 참여하고 지역 활동에 참여하면서, 불완전한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 이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배우고 있다.
otbeginner@gmail.com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 남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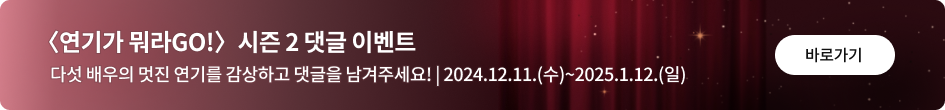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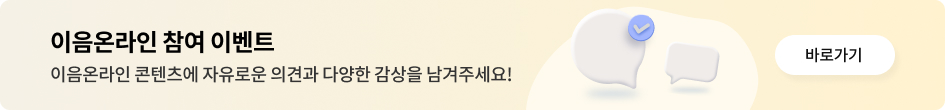



 이전글 보기
이전글 보기
 다음글 보기
다음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