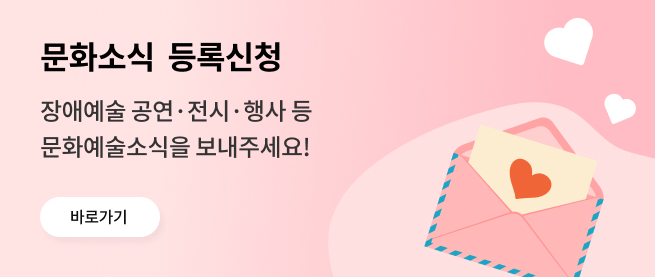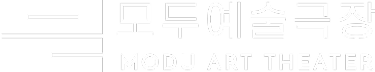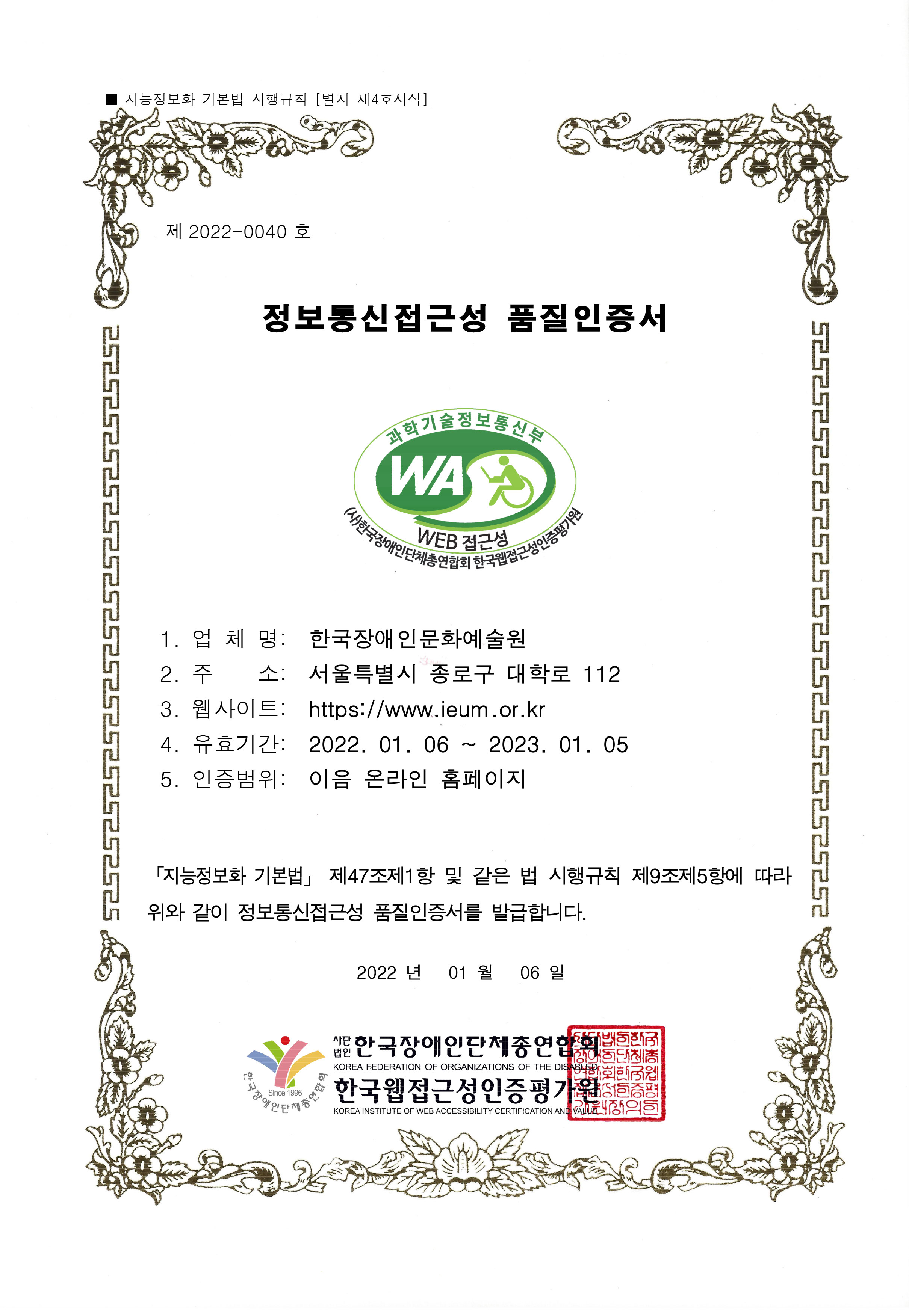이음광장
“제 호흡하는 소리를 잘 따라오세요.”
지휘자님은 몸짓으로 숨소리를 만들며 우리를 이끈다. 눈으로 악보를 보거나 손짓을 따를 수 없는 우리 시각장애인 단원들에게, 그의 들숨과 날숨은 그 어떤 악보보다 정확한 언어가 된다. 그 감각적인 호흡에 맞춰 우리는 〈히브리 러브송〉의 첫 소절을 한 템포 뒤에 정확히 밀어 넣는다. 호흡의 길이가 박자가 되고, 쉼이 음악이 되는 순간이다. 비장애인인 지휘자의 호흡은 그냥 숨소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만들어 낸 소통 방식이다.
나는 성인이 되어 중도에 시력을 잃었다. 그래서 점자를 읽지 못한다. 점자는 조기에 배우지 않으면 좀처럼 익히기 어려운 문자 체계다. 우리 합창단만 해도 그렇다. 동료 중 몇몇은 점자 악보를 더듬어 음을 익히고, 나처럼 녹음된 음원에 의지해 멜로디를 외우는 이도 있으며, 희미한 잔존 시력으로 악보를 보는 이도 있다. 테너,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각기 다른 음역만큼이나 음악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제각각인 우리 장애인 단원들을 위해, 비장애인 동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세심한 이해와 배려가 요구되는 일이다.
때때로 나는 연습 과정을 녹음하는데,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읽어주는 스크린리더의 음성이 불쑥 튀어나와 얼굴을 붉힐 때가 있다. 합창의 화음 속에 섞여든 그 소리는 분명 거슬리는 소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간혹 아슬한 긴장감(?)이 감도는 풍경을 자아내곤 한다. 하지만 나의 ‘필요’일 뿐임을 모두가 알고 있기에 묵인과 수용의 경계 어디쯤을 지나쳐 간다. 내가 나의 필요와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은, 장애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함께 노래 부르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단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나의 필요는 비장애인보다 더 많고 더 구체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권리와 의무로 나누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장애인이라는 이름표는 때로 우리에게 ‘장애인다움’을 요구한다. 마치 문서 속에 규정된 전형적인 장애인의 모습이 있다는 듯이 말이다. 장애인이 진정 규정된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일까? 진심에서 우러나온, 장애인의 상황을 헤아린 작은 수고로움과 이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 합창단에서 발달장애인 동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황했다. 시각장애인인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떤 배려를 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자연스레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연습 중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순수한 모습에 웃음 짓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음정과 박자 감각에 감탄하며, 우리는 서로를 장애의 유형이 아닌 한 명의 동료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는 어떤 지침도 규정도 필요 없었다. 진심에는 규정이 없었던 거다.
“턱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세 칸의 계단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다.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안내가 얼마나 큰 수고로움의 결과인지, 나는 이곳에서 깨닫는다. 공연장의 복잡한 동선 속에서 우리를 무대로 이끌고, 마이크 높이를 맞춰주고, 안전하게 퇴장시키는 모든 과정.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주는 ‘인간 내비게이션’들의 세심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어떻게 배려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지침이 혹여 진심을 밀어내는 우를 범하게 될까 걱정스럽다.
우리 물빛소리 합창단에게는 연주홀과 미술실, 두 개의 공간이 있다. 연주홀에서 음악으로 하나가 된 우리는, 미술실에서 비로소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사람’으로 만난다.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떡을 나누며 생일을 축하하고, 시원한 수박 한 조각에 아픔을 위로받는다. 그곳은 권리나 접근성을 이야기하는 투쟁의 장이 아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고 넘어지며 살아가는, 우리네 사람 사는 이야기의 축소판이다.
우리 합창단에는 〈물빛의 노래〉라는 주제가가 있다. 단원들이 한 소절씩 마음을 보태 만든 가사에 비장애인 작곡가가 아름다운 곡을 입혔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약속이나 한 듯 눈물을 흘린다. 특히 “우리의 노래가 머무는 곳에 꿈이 피어나네”라는 가사는 매번 나의 심장을 울린다. 올해 7월 15일, 우리는 ‘2025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에서 이 노래를 불렀고, 대상을 받았다. 우리의 꿈이 현실로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장애인이 받은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모니를 이루어 작품을 만들었고, 대상을 받은 것이다.
문서에 적힌 지침을 따르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 모든 이야기를 지침으로 문서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권이란 본디 종이 위에 적힌 빼어난 문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이기 때문이다.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려 애쓰는 세상. 우리가 함께 공존해야 할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합창단의 모든 이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단원들과 단장님, 지휘자님, 반주자님, 그리고 근로지원사님과 활동지원사님 모두에게.
“비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폭싹 속았수다.”
이는 당신들이 정해진 규정에 속아 넘어갔다는 짓궂은 농담이자, 제주도 방언의 본뜻을 담아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함께해 준 당신들의 노고에 대한 나의 진심 어린 찬사다.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물빛소리 합창단 〈Kyrie〉, 제1회 정기연주회(구로아트밸리 대공연장, 2024)
영상 출처. 유튜브채널 코웨이 사회공헌

염경례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에서 바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맑고 밝은 소리가 되어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고 싶다.
soriel1016@hanmail.net
사진 제공.필자
2025년 8월 (66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 남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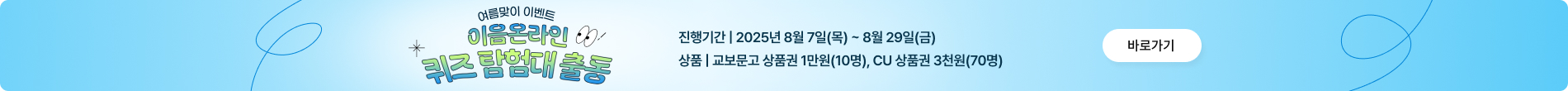


 이전글 보기
이전글 보기
 다음글 보기
다음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