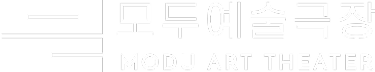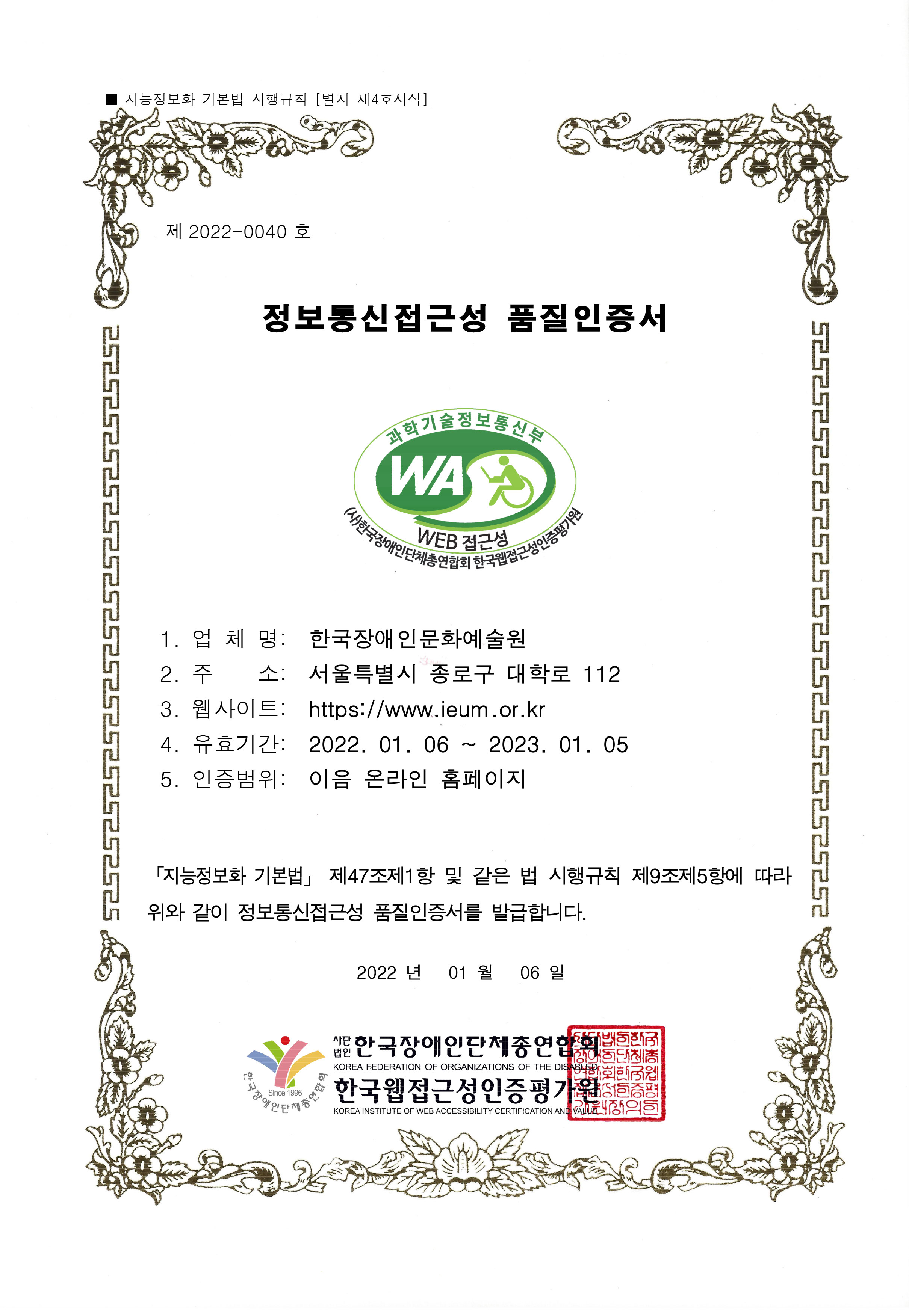이음광장
공연 당일, 난 관객에게 젤로(가명. ‘미켈란젤로’의 줄임말)를 ‘장애예술인’이라고 소개했다. 젤로를 제외한 63명의 공연자 모두 무대에 혼자 올랐는데 왜 젤로만 누군가와 함께 무대에 올랐는지 설명하고자 나와 젤로의 짧은 소개를 공연 첫머리에 덧붙인 것이다. 그러나 공연이 끝나고 젤로의 언니이자 내 친구인 H가 던진 두 가지 질문에 난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
“젤로를 굳이 장애예술인이라고 소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난 젤로의 장애가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관객이 공연 맥락을 파악하려면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젤로를 장애인이라 규정하지 않고도 장애를 드러낼 방법은 많았다. 젤로는 장애인이 아니어도 예술인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공연’을 위해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장애인이라고 규정해도 되는 걸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손쉽게 구분 지은 나의 행위가 나와 젤로 사이의 권력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젤로는 그렇게 소개되는 것을 원했을까?”
장애예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젤로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그 동의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답할 수 없었다. 이 사회에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함의하는 바를 젤로가 삶 속에서 체화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H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찾아내려다 보니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 순간 난 오로지 반성밖에 할 수 없었다.
“음…. 물론 젤로에게 물어보고 동의를 받긴 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장애예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좋은 결정이 아니었던 것 같네….”
결정. 젤로와 공연을 준비하며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인지 한 단어로 답하라면 단연코 ‘결정’이라는 단어를 택하겠다. 좋을 때도 귀찮을 때도 “응”이라고 대답하곤 하는 젤로에게 어디까지가 질문이고 어디부터가 회유인지 그 경계를 구분하는 것, 즉 어디까지 동의를 구해도 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실제로 동의를 구하는 행위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다. 이는 젤로와 일상을 함께할 때도 마찬가지다.
젤로는 먹고 싶은 음식이나 입고 싶은 옷, 갖고 싶은 물건에 대해선 좋고 싫음이 명확한 편이지만 그 밖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심할 때가 많다. 그런데 젤로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에 대해 다짜고짜 동의를 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장애예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젤로에게 물을 때 난 젤로가 어떻게 대답할지 알 것 같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얻어낸 “응”이라는 대답은 결코 제대로 된 동의라고 할 수 없었다.
모두가 그러하듯 젤로 일상에서 결정할 거리가 가득하다. 사용한 컵을 꼭 씻어두어야 하는가, 쓰레기를 꼭 분리 배출해야 하는가, 상품을 계산하기 전에 먹어도 되는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말없이 가져가도 되는가, 달콤한 음식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도 되는가, 지병이 있는데 술을 마셔도 되는가. 이럴 때 보통은 질문이 적절하지만, 회유가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젤로와 일상을 함께하며 느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내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건 H나 젤로의 친구들, 젤로를 잘 아는 이웃이나 활동가들의 조언이었다. 그들은 내 결정이 무조건 틀렸거나 옳았다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내가 고려할 수 있었던 다른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내 상상력의 한계를 확장해 주는 고마운 동료들이다. 젤로를 대할 때 자신의 원칙이 ‘무원칙의 원칙’이라던 H의 말은 도저히 잊히지 않는다. 내가 지금에서야 고민하는 것을 훨씬 먼저부터 고민했을 그조차 젤로의 삶에 대해선 함부로 무언가를 정답이라 말하지 않는다.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 겸손한 태도 아닐까. 상황을 막론하고 한 가지 고정된 결정에 젤로의 삶을 맞추기보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타협하고 다채로운 결정을 내릴 줄 아는 활동지원사가 되고 싶다.
젤로와의 공연을 준비할 때 H와 젤로의 친구, 이웃들 앞에서 여러 번의 예행연습을 거치고 조언을 구했다. 공연 준비도 공연도 내겐 처음이었기에 조금이라도 좋은 공연을 만들려면 빼놓을 수 없는 절차였다. 젤로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공연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다양한 조언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릴 것인지, 여러 선택지 중 무엇이 최선인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많았다. 그러나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이 나의 몫인 것은 분명했다.
공연 하루 전날, 늦은 밤까지 젤로와 함께 연습하고, 혼자서도 반복 연습했다. 연습하면서 어색한 부분을 조금씩 수정하고 새로 추가하기도 했다. 장애예술인이라는 표현도 이날 추가했다. 변경한 내용을 젤로 앞에서도 들려주며 연습했지만, 젤로는 자신이 간식을 먹는 부분과 노래하는 부분, 춤추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무관심해 보였다. 다른 부분에서 내가 무언가를 수정해도 되냐고 질문했을 때 젤로의 대답은 한결같이 “응”이었다. 공연을 하루 앞둔 사람의 다급함 때문이었을까, 더 이상 조언이 귀찮거나 싫은 마음 때문이었을까. 난 아무런 고민 없이 젤로의 대답을 그냥 믿자고 결정해 버렸다.
활동지원사인 내게는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들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을 것이고 내 실수를 뉘우치지 않을 것이며, 내 상상력의 한계 속에 젤로와 나의 삶을 가둬놓게 될 것이다. 좋은 결정을 한다는 건 자기 삶에서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필요하듯이, 활동지원사인 우리가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다양한 조언을 건네줄 동료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지원사에게도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젤로와의 앞날을 더 찬란하게 함께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지원으로 내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다. 치열하게 물들고 싶다.
친구, 이웃들과 함께 있는 젤로와 필자

이준기(석류)
장애인활동지원사, 마포의료사협 무지개의원 방문작업치료사. 병원에서 계약직 작업치료사로 일하다가 장애인의 몸을 교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의료시스템에 환멸을 느껴 병원을 나왔다. 지금은 친구이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인 ‘미켈란젤로’와 함께 동네 친구들을 만나고, 각종 마을 행사에 참여하고 지역 활동에 참여하면서, 불완전한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 이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배우고 있다.
otbeginner@gmail.com
사진 제공.필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 남기기
비밀번호
작성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좋은 결정을 위한 조언을 구하고, 고민하고, 장애인의 입장을 대신해 보려는 노력에 무한한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자기의사가 분명한 장애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이 많기에 선택적 질문에 "응"이라는 답변은 참 흔한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의 선택지가 상대를 향한 긍정의 것이 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결정을 위해 다양한 경험치를 가진 분들과의 교류와 논의가 필요한 것도 분명한 것 같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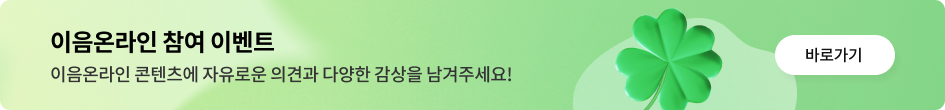




 이전글 보기
이전글 보기
 다음글 보기
다음글 보기